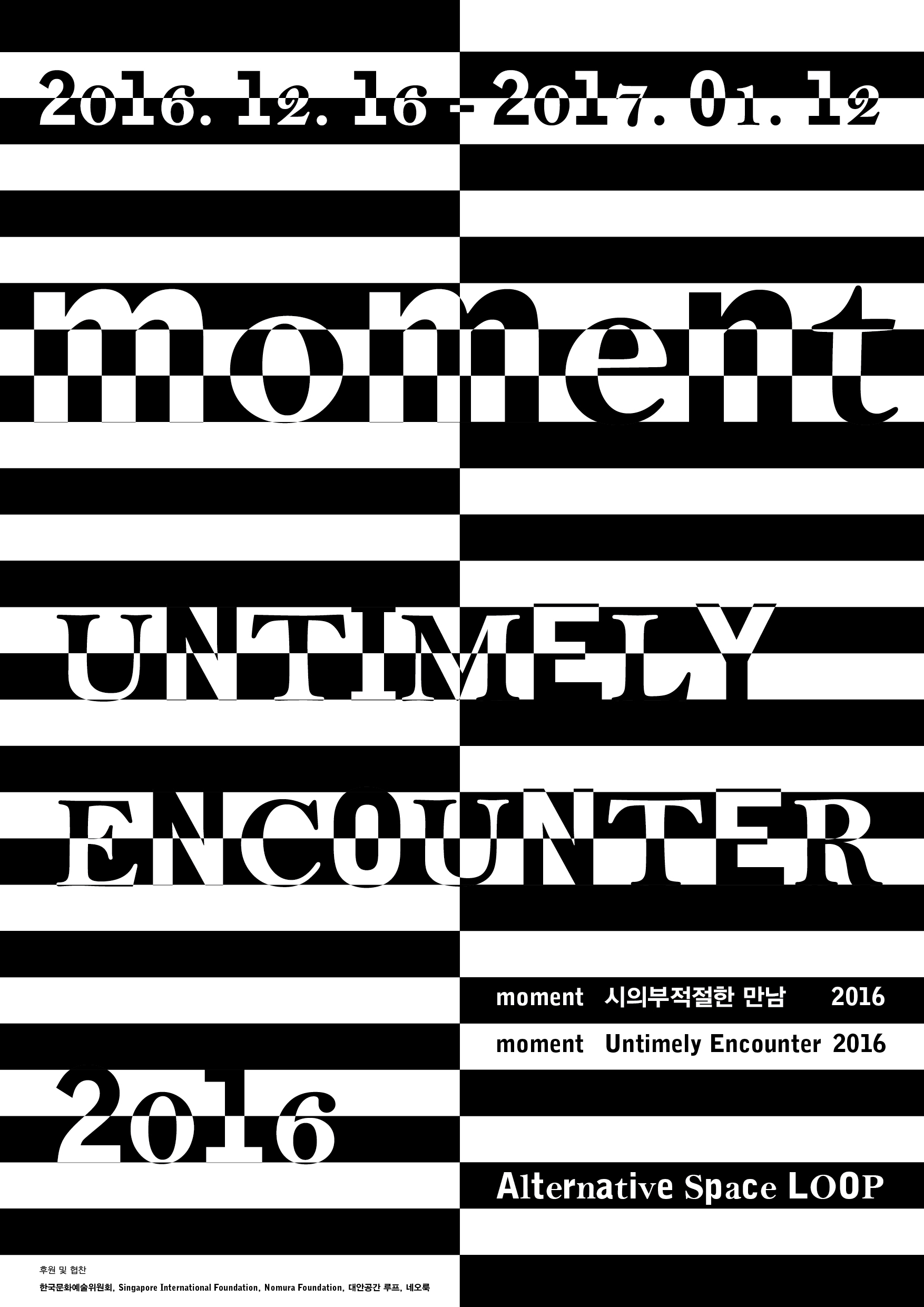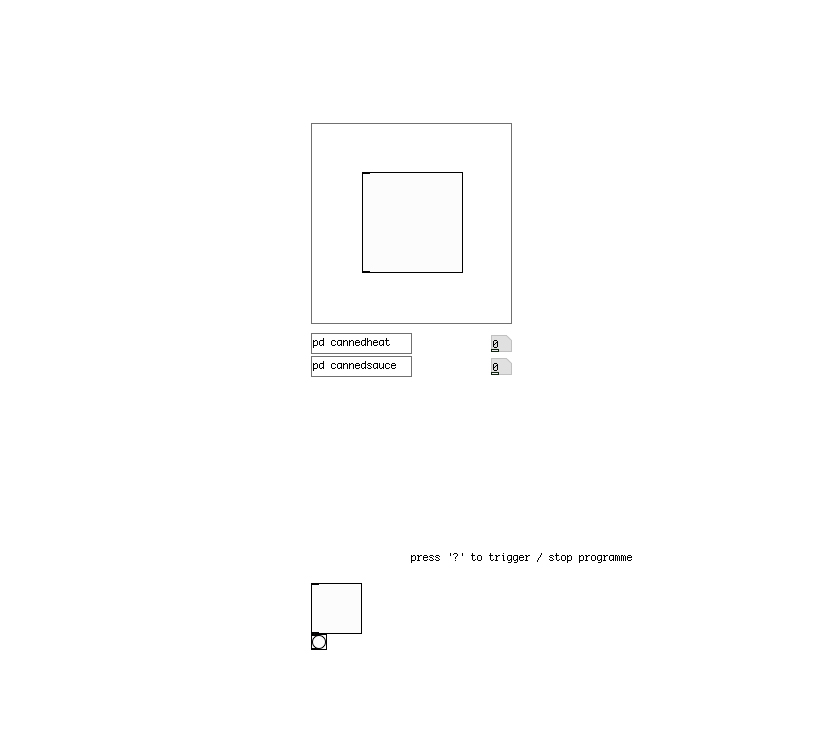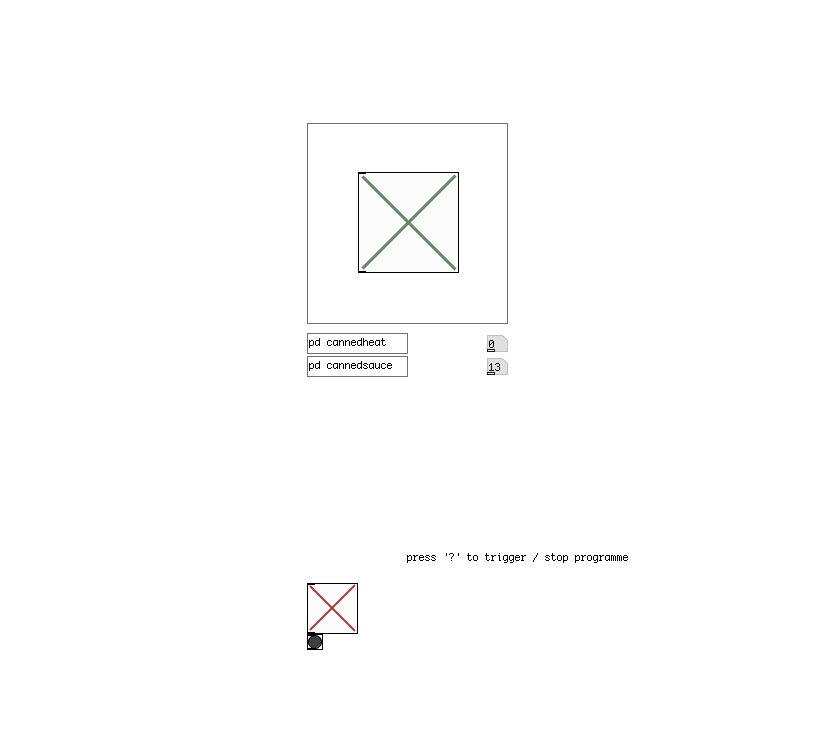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현대성에 대한 성찰적 프로젝트이자, 현대의 상황에서 ‘충동’이 어떻게 신자유주의_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탁으로서 탄생한 ‘생명정치’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충동은 정서(정동)의 응집과 소멸, 전이와 혼란에 따라서 ‘생명’에 대한 통치가 집단적 절멸로 치닫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술가의 활동을 광의의 의미에서의 ‘퍼포먼스’라고 보고, 그 활동의 생산물, 결과물, 잔여물이 각종 매개하는 현장을 전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먼트라 함은 일종의 ‘갈라짐의 순간’이며, 그 순간에서 양가적으로 돌발하는 정서(정동)의 충동 차원과 그것의 이동을 주의깊에 보고 있습니다. 세대와 시대, 작가와 작품, 몸과 고유성, 순간성과 시간성, 로컬과 글로컬 등이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동일한 것의 다른 양상처럼 갈리지는 기점을 우선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참여 작가들은 주로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들로서, 싱가포르의 퍼포먼스 아티스트들과 일본의 사진 작가들, 그리고 한국의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지난 3 년여 간 진행한 2016 년의 시의부적절한 만남에서는, 일부 작가들과의 현장 리서치, 싱가포르 현지에서의 작가와 현대미술 리서치, 일본의 학자와의 지속적인 토론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혹은 현대 주체)의 현재 행위차원을 ‘퍼포먼스’로 보고, 작가 리서치를 실행할때, 그들 혹은 아카이브에서의 과거의 작업이나 프로젝트가 현재에 반복-순환-중첩-잔여 등의 과정으로 반복, 회전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퍼포먼스의 잔여로서의 전시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별 차이, 작품 간의 차이, 작업 방식의 차이, 살아가는 스타일의 차이 등으로 보이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들은 비슷한 것들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를 위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시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사회의 정서에 있어서 충동의 차원이 혐오로 흐르느냐, 아니면 행위로 흐르느냐의 문제는 양단 간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의 행위에 있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의 내기 또한 그렇습니다.
반복이라는 메커니즘은 동일한 것의 반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의 대상이 계속 비판의 대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둘러싼 판타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복은 판타지를 제거하고 탈신비화시켜서 그 대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반복은 어떤 생산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어떤 잠재성의 자리라면 강요나 의무가 아닌 ‘충동’은 여기에서 그것을 발현하는 기제가 됩니다. 그리하여 충동이 증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장, 사건들, 그리고 그것의 지속가능성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가능성은 1990 년대의 휴먼에 관한 것(윤리적 인간, 다문화주의의 리버럴한 인간, 건전 글로벌 시티즌)이 지금 2010 년대 지금, (의사)반복 혹은 회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걸린 내기들을 살펴봄으로써 점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직전, 파시즘적 내셔널리즘과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치적 올바름, 다문화주의에 대한 찬양, 건전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 강조, 문화다양성의 거품 등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2000 년대는 그것의 신자유주의적 상품화와 푸코식의 통치성이 효율적으로 먹혀들어간 시기로서, 다시한번 리버럴-파시즘적 상황에 처한, 베어라이프의 대두와 극단적 상황들이 만연함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2000 년대에 배태된 네오 파시즘적 상황에 저항하면서 한편으로 1990 년대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다문화주의의 허황됨을 비판합니다. 이 비판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2000 년대식 비판(낭만적인 인텔리들이구만), 2010 년대식 비판(거품 속에서 결국 네오 파시즘을 불러왔잖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지구화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라라고 종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지구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지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이상 재미 없는 (판타지가 기능하지 않는) 차원이 도래함으로써 진정으로 다른 차원으로 뒤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상들의 일례로, 정서의 전환이 있습니다. 가령 가만 보면 지난 2000 년대를 통해 배태된 ‘지침’, ‘무기력’, ‘비아냥과 냉소’, ‘혐오’ 등과 ‘도착’적 양태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터전인 ‘충동’이 혐오와 같은 차원에 휩쓸려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충동은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한 열망’에 대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술매체 속에서 제가 충동적 차원을 불러일으키는 데 뽑고 있는 것이, ‘shame’, ‘증상적인 것들’, ‘개별 주체 몸의 우연한 어떤 측면들-행동 속도, 표정, 목소리’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개 양상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폭력_놀이_유희’, ‘농담’, 괘변’, ‘에피메랄리티_지속_시간성’ 등에 의해서입니다.
이제는 ‘비천해지기’와 ‘숭고해지기’ 사이에 예술이 있지 않습니다. 정서적 껄끄러움과 시간적 차원에서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는 중첩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술은 새롭게 추상성을 획득하며 시간매체로서 ‘사라지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가들의 행위를 우리는 예전에 작업, 프로젝트 등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퍼포먼스’라고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그것의 잔상 혹은 남겨진 잔여물이라고 하는게 낫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곧 소멸될 퍼포먼스의 잔여물은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겠지만 결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산죽음과 죽음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즉 그것은 거래불가능한 예술입니다.
글: 이병희